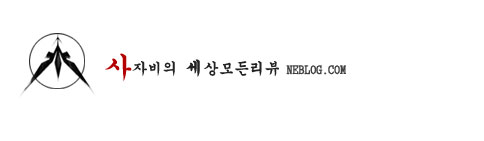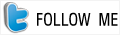응답하라 1997, 성장통 그린 한국형 케빈은열두살
Posted at 2012. 7. 26. 08:16// Posted in 드라마 리뷰응답하라 1997, 성장통 그린 한국형 케빈은열두살
어린 시절에 즐겨보던 미드가 있었다. 바로 '케빈은 열두살'. 이 드라마의 원제는 'The Wonder Years'로 미국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누리며 시즌6까지 방영되었다. 아시는 분은 아시리라. 오늘날에야 ER이나 CSI가 시즌10도 넘어가는 엄청난 장편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당시만해도 시즌6까지 간다는건 그 자체로 그 드라마의 인기가 어떠한지를 단적으로 알려주는 기준 역할을 했었다는 것을.
국내에선 KBS에서 시즌4까지만 방영했는데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다. 이 드라마와 응답하라 1997가 어떤 공통점이 있길래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자는 것인지 의문을 표하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 주요 컨셉 자체가 성장통을 그리고 있고 과거를 회상한다는 측면이 바로 그것이다.
- 남주와 여주가 같이 자람
- 과거의 기억을 이야기로 풀어 나가는 진행, 나레이션은 남주
- 시대적 배경
시대적 배경은 조금 복잡하므로 풀어서 이야기 하겠다. 케빈은열두살은 베트남전쟁 이후 히피문화가 미 전역을 휩쓸던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이 작품의 여주인 위니의 오빠는 베트남전쟁에 참가했다가 죽고 위니는 슬픔에 빠지는 에피소드가 나오기도 한다. 케빈에게는 히피문화에 빠진 누나가 있고 케빈의 아버지는 한국전에 참전한 참전용사였다.
이 드라마의 성공배경에는 케빈의 성장과정 자체가 시청자의 공감을 얻은 부분도 있지만 그보다는 가족 전체가 시대적 흐름에 따른 현실의 반영이라는 측면이 사실상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미국인들에게는 그 당시가 미국경제와 문화 전반적으로 큰 부흥기이자 변화의 시기였기에 그로부터 십여년 후인 1988년에 제작된 이 드라마는 아주 멀지도 가깝지 않은 그런 시기의 추억을 되살려 주는 역할을 했었던 것이다.
응답하라1997은 HOT로 대변되는 1990년대 중후반을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케빈은열두살(이하 케빈)이 국내에선 아동용 시간대에 편성되긴 했지만 사실상 어른을 대상으로 하는 추억물이었다면 '응답하라' 역시 오늘날의 20대 중반부터 30대 중반까지를 타겟으로 하고 있다. 물론 아이돌이 등장하는 만큼 청소년들이 보기에도 좋겠지만 그에 한정되지 않고 실질적인 타겟 연령을 넓혀놓았다는 말이다.
이작품을 흥미롭게 보게 되는 이유 중 특징적인건 주인공이 부산에 산다는 점이다. 필자는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당시의 HOT열풍은 생생히 기억하는 편이지만 막상 여학생들이 얼마나 열성적으로 팬활동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까지는 알지 못하였다. 그런데 드라마로 보니 공감가는 부분과 더불어 새로이 알게 되는 부분이 덧붙여져서 필자 뿐 아니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추억으로 재탄생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야기는 동창회에 참석하게 되는 성시원과 친구들로부터 시작된다. 때는 꽃다운 18세일때 반에서 성적은 꼴찌지만 HOT의 토니안을 생각하는 마음은 1등인 시원에겐 어릴때부터 같이 자란 전교1등 윤윤제가 있었다.별밤 공개방송에 쫒아 다니고 잡지에서 사진을 오려서 보관하는 여학생들의 모습 뿐 아니라 에피소드내의 대사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추억을 자극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땐 그랬지"를 연발하게 만드는 것이다. 너무 먼 이야기도 하니고 불과 십여년전 일인데도 마치 아주 먼 오래전 이야기처럼 느껴지니 시대흐름은 걷잡을 수 없이 그렇게 빠르게 흘러가나보다. 극의 내용중에는 가족끼리 노래방에 갔는데 오랜만에 옛날 노래를 불러 본다며 선곡한게 HOT의 '캔디'였고 부모는 그게 무슨 옛 노래냐고 하자 시원은 '나에겐 이게 오래전 노래'라고 말한다.
세상은 급변하고 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모두 엄청난 속도로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불과 십여년전 세상은 머리에 염색하고 핫팬츠를 입고 나오는 여성가수들을 상상할 수 없었던 시절이다. '응답하라1997'은 전세대와 현세대를 잇는 가교 역할 뿐 아니라 극 자체로도 재미있고 아이돌이 작품에서 메인을 담당해도 어색하지 않은 tvN이 아니만 기획할 수 없는 드라마인듯 싶다.
앞으로도 추억을 되살리면서도 현대적 감각에 어울리는 그런 드라마를 만나보고 싶다. 응답하라1997는 그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